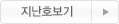편지공모 우수작
진심으로 사랑했었구나!
글. 이은숙 (경기도 이천시)
아이를 사랑했고,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뒤로한 채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저는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아 가게 되었지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어머님들께도 죄송하여 말 한마디 인사한번 건네지 못한 채 마음을 담은 선물꾸러미를 졸업식 날 남몰래 아이들 가방 안에 하나씩 넣어두었던 것이 저의 마지막 마음 표현이었답니다.
아이들 생각만하면 미안하고 보고 싶고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엄마 같은 존재의 담임선생님이 새로 오셨으니 저는 참고 또 참으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아이들과 적응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예전 저희 반 아가와 엄마를 마주치게 되었지요. 순간 너무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윤서야~~ 선생님이야 이리와 사랑해 해줘~”하고 말을 하자 원망의 눈초리로 저를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만 보며 망부석이 되어버리더군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라 2주의 시간이 길었나보네요. 벌써 저를 잊어 버렸나 봐요” 하고 어머님께 쑥스러움과 미안함을 담은 말을 건네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가 엄마의 등 뒤로 숨더니 정말 큰 소리로 울어버리더군요. 둘 다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그 순간, “선생님… 흑흑흑”하면서 더 크게 울며 저에게로 달려오는 윤서…. 네 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두들 쳐다볼 정도로 저에게 안겨 대성통곡을 합니다. 저도 엄마도 함께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멈추질 않네요.
윤서는 제가 원망스러웠나 봅니다. 일 년 동안 밥 먹여주고, 간식 챙겨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동화책 읽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던 엄마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으니…,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집에서도 “선생님 보고 싶어” 하는 말을 자주 했고, 예전보다 힘없이 축 쳐진 윤서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셨다는 어머님. 제가 오리엔테이션 날 보이지 않아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셨지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헤어지는 일이 제게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처럼 사랑했기에 이별은 언제나 슬프기만 합니다. 윤서와 재회를 하면서 막막함에 목이 메어오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친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떠나면 나중에 만났을 때 이런 먹먹함, 이런 슬픔을 느끼겠구나! 아이는 커다란 원망을 하면서도 사랑하기에 울면서 달려올 수밖에 없겠구나’
윤서는 제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안겨서 손을 꼭 잡고만 있더군요. 어머님께서 집에 함께 들어가자고 하여 처음으로 윤서의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아이는 몇 시간 동안이나 저에게만 붙어있었고 재잘재잘 2주 동안의 설움을 풀기라도 하는 듯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 온다하니 엄마 곁에는 가지도 않고 화장실 문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어찌 이런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픔을 달래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난 해 윤서가 세 살 때 저와 같이 지냈던 당시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놀이공원에 가자, 놀이터가자, 엄마와 놀자… 하고 윤서에게 엄마가 이야기를 해도 언제나 어린이집에 가겠다던 윤서였습니다. “안돼! 어린이집 갈 거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하며 야무지게도 엄마를 달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엄마 아빠 휴무 날까지도 어린이집에 꼭 등원을 하던 정말이지 신기하기만 했던 우리 윤서입니다. 세상에 세 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어린이집을 좋아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었나봅니다. ‘아이들과 제가 진심으로 상호작용을 했던 한 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같이 느껴졌고, 윤서 또한 저를 엄마선생님으로 느꼈었나 봅니다. 가끔씩은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던 우리의 아가들~~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이별이 이렇게나 슬프고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서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가끔 놀이터에서 만나 놀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아이에게서 하나 더 배우고 크나큰 사랑을 안고 갑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나봅니다. 언제나 아이들에게 받기만 할 뿐…. 그 사랑에 보답을 할 수가 없네요.
어린이집 교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Copyrights(c) 2009~2016 <웹진 아이사랑> All Rights Reserved. 웹진 아이사랑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도용이나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